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시계를 확인하고, 달력을 보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존재했던 시간 없는 사회들에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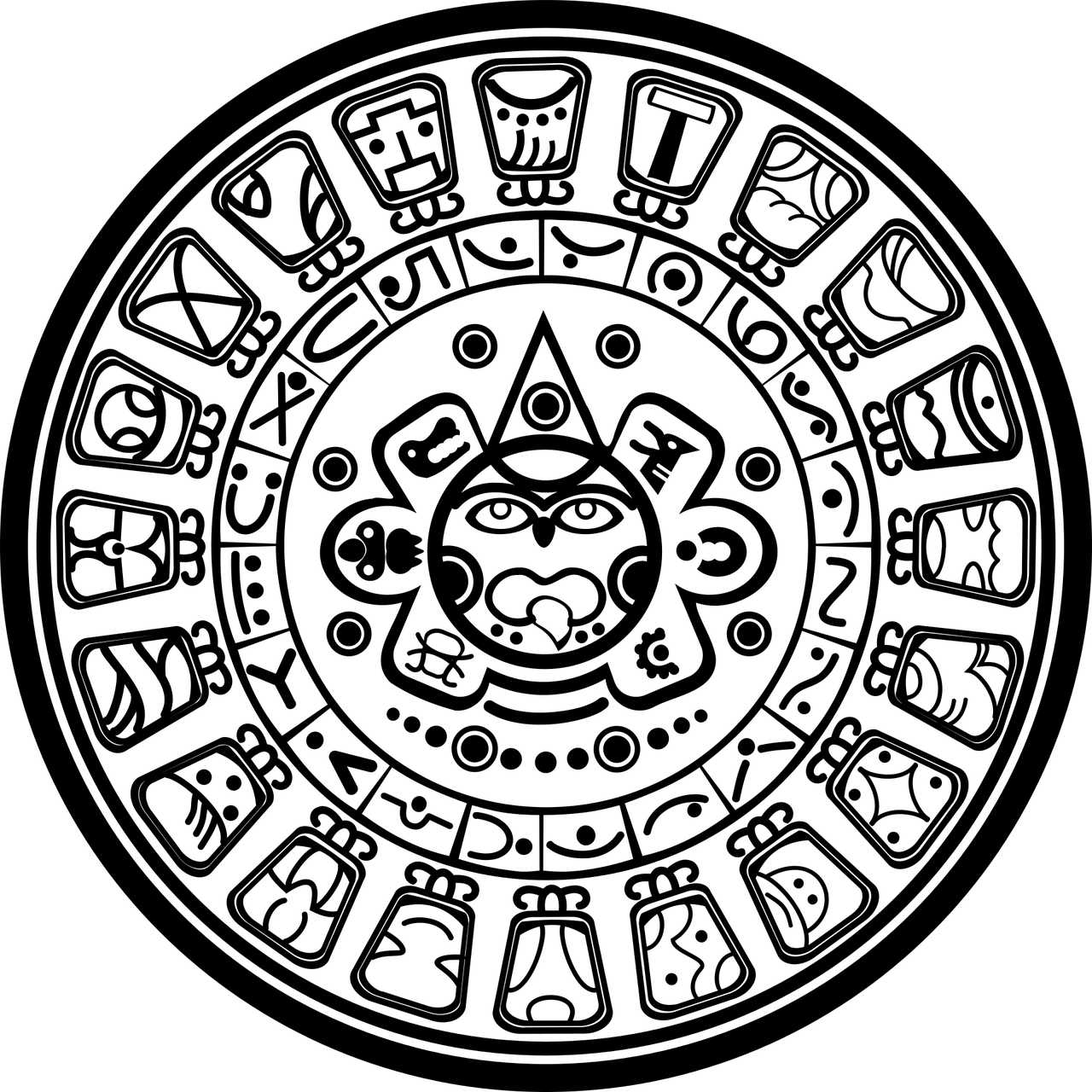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약속을 ‘언제’로 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 감각’은 정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달력’이 없거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한 문화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류학과 언어학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시간 없는 사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간 개념의 상대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 파이다하족: ‘과거’, ‘미래’ 개념 자체가 없다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사는 브라질의 파이다하(Pirahã)족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부족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시간’ 관련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과거형, 미래형 동사가 없다
- 숫자 개념도 1, 2 정도로만 존재하며, 그 이상의 수량 개념은 없음
- “어제”, “내일”, “오전”, “오후” 등 시간의 구체적 지시어가 존재하지 않음
이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무관심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생활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파이다하족은 종종 ‘현재만 사는 부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 상대성 이론과 시간
파이다하족의 사례는 ‘언어가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언어 상대성 이론(Sapir-Whorf hypothesis)의 중요한 근거로 언급됩니다. 이들은 언어 속에 시간이 없기에, 사고방식 자체에서 시간의 흐름이나 계획의 필요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단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으로 구성된 관념이며, 인간의 두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달력이 없는 삶: 계절은 기억하지만 날짜는 모른다
📌 누바족과 에콰도르 부족들: 시간은 하늘과 땅의 변화로 느낀다
수천 년 전부터 달력을 쓰지 않고도 살아온 부족들은 여럿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수단의 누바족(Nuba)이나 에콰도르 아마존의 슈아르(Shuar), 아추아르(Achuar) 등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수치’가 아니라 ‘징후’입니다.
- 농사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별자리나 새의 울음소리로 판단
- 계절은 비가 오기 시작했는가, 개구리가 우는가 등 자연의 변화를 통해 체감
- 중요한 날을 기억할 때도 “큰비가 오기 직전의 사냥”처럼 사건의 연쇄로 말함
달력이나 시계가 없지만, 삶의 흐름은 대자연의 리듬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이 5월 20일인지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건 정확히 알고 있죠.
📌 시간은 직선이 아닌 원
이들 부족에게 시간은 서양식으로 직진하는 선형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순환적인 주기, 즉 원형 개념에 가깝습니다.
-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마르고,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
이들은 일정한 ‘순환의 패턴’을 인지하되, ‘몇 년도 며칠’ 같은 수치화된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시간을 수치로 통제하려는 현대 문명과는 다른 시간관을 보여주며, 인간이 시간 없이도 충분히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시간 감옥, 그리고 원시 부족의 자유
📌 현대 사회의 시간 강박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일정표, 마감, 스케줄, 알람, 리마인더
-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돈이다” 같은 말들이 일상화
- 늦거나 잊으면 무능력하다는 평가
이처럼 시간은 우리에게 단지 ‘흐름’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며,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규율 권력’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 반대로, 시간 없는 사회의 여유
달력이 없는 부족들은 일정을 짜거나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사냥을 가야 하는지, 언제 공동체 행사를 해야 하는지 자연의 리듬과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 조율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현대 사회에 바로 적용되긴 어렵지만, 이들의 시간관은 현대인에게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 시간은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다
달력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집단적 합의의 장치’입니다.
- 그레고리력은 16세기 교황이 만든 인위적 제도
- 한 주 7일의 구조도 바빌로니아 점성술에서 기원
- 시간대 역시 19세기 산업화 시대의 철도 운행을 위해 생김
즉,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시스템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발명품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시간에 쫓기는 삶’에 대한 관점도 조금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달력이 없는 부족들, 과거와 미래가 없는 언어, 계절을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시간 없는 사회의 사람들은 더 단순하고,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모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시간 중심적 사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